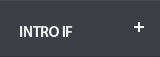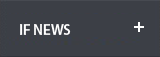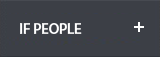- 이프북스
- 대표 유숙열
- 사업자번호 782-63-00276
- 서울 은평구 연서로71
- 살림이5층
- 팩스fax : 02-3157-1508
- E-mail :
- ifbooks@naver.com
- Copy Right ifbooks
- All Right Reserved
 HOME > IF NEWS > 여성신화
HOME > IF NEWS > 여성신화

-
[9회] 오줌갈기기 내기에서 남자를 이긴 여신
이프 / 2012-03-05 10:07:13 -
-자청비 신화1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여신이다. 자청비가 등장하는 이 <세경본풀이>는 제주신화로는 보기 드물게 사랑에 관한 테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인 자청비는 사랑과 농경의 여신이다.
시주가 한 근 모자라 태어난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 여자
옛날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가재와 전답이 많고 비복을 거느려 부러울 것 없는 살림이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시름이 많았다. 부부는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정성을 드렸다.
그런데 시주가 한 근 모자라, 열 달 후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앞이마엔 해님이요, 뒷머리엔 달님이요, 두 어깨엔 금 샛별이 송송히 박힌, 귀여운 아이였다. 자청하여 낳았으니 자청비라 이름 지었다.
“맨날 빨랠 하니 손이 곱답니다” 는 말에, 빨래터로 가는 그녀
열다섯 살이 되자 아버지는 자청비에게 베틀을 만들어 주었다. 자청비는 베틀 솜씨가 빼어나 세상에 다시없는 최고의 비단을 짜냈다.
어느날, 자청비는 몸종인 느진덕정하님의 손이 새하얗게 고운 것을 보고 물었다.
“넌 어째서 손이 그렇게 고우냐?”
“맨날 빨랠 하니 손이 곱답니다.”
하님(하녀)의 말을 듣고 자청비는 빨래를 하러 갔다. 마침 하늘의 문도령이 아랫녘으로 글공부를 하러 내려오다 빨래하는 자청비를 발견했다. 둘은 첫 눈에 반했다. 자청비는 부모님을 졸라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하러 들어갔다.
사랑을 좇아 남장을 한 자청비
그날부터 둘이는 한 솥 밥을 먹고, 같이 앉아 글공부를 하고, 한 방에서 기거했다.
하루는 은대야에 물을 가득 떠다 은저 놋저를 걸치고 두 사람의 이부자리 사이에 가져다 놓고 자는 자청비를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문도령이 물었다.
“문도령, 글공부하러 올 때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잠 중에도 이 젓가락을 떨어뜨리지 않게 명심해야 공부를 잘 하게 된다고 하더라.”
그날부터 문도령은 혹여나 잠결에 대야의 젓가락을 건드려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여 잠을 설쳤다. 자청비는 마음 놓고 잤다. 결국 글공부하며 조는 문도령의 성적은 자꾸만 떨어지고 자청비는 읽는 것도 일등, 쓰는 것도 일등, 항상 장원이었다.

▲자청비. 강요배 그림
문도령과의 내기
문도령은 무엇이든 이기고 싶었다. 자청비에게서 아무래도 여자맵시가 난다고 의심하게 된 문도령이 수를 썼다.
“이보게 자청도령, 우리 오줌갈기기 내기나 한번 하세!”
문도령은 여섯 발 반이나 내쏘아 갈겼다. 자청비는 대나무 붓통을 하문에 끼우고 끄응 힘을 주어 갈기니 열두 발 반이나 내쏘았다.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자청비는 꾀를 내어 문도령을 이겼다.
눈치 없는 문도령에게 핀잔을 주다
그러던 어느 날 문도령에게 글공부는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서수왕 딸아기한테 장가를 가라는 편지가 하늘 옥황에게서 왔다. 자청비도 따라나서며 둘러댔다.
“나도 어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전갈이 와서 돌아가야 하네. 가는 길도 동행하게 됐군.”
둘은 같이 내려오다가 처음 만났던 연화못에 이르렀다.
“문도령, 삼년 같이 공부했으니 묵은 때도 씻을 겸 목욕이나 하고 헤어지자고.”
“그거 좋지. 그런데 넌 어디 가냐, 여기서 안 씻고?”
“무엇이든 너보다는 위였으니, 난 윗물에서 하겠어!”
자청비는 하겠다던 목욕은 않고, 버들잎을 따서 편지글을 쓰고는 동글동글 띄워 보냈다.
“눈치 없는 문도령아, 멍청한 문도령아! 삼년 한 방에서 자고 먹고 같이 살아도 남녀 구별도 못하는 눈치 없는 요 문도령아!”
만단정화와 함께 드디어 사랑을 풀다
버들잎으로 쓴 자청비의 편지를 보고서야 문도령은 알아차렸다. 황급히 옷을 꿰어 입고 자청비를 따라 갔다. 자청비는 부모님께 문도령을 열다섯 아래의 여자아이라 속이고 집안으로 들였다.
자청비는 열두 폭 치마로 갈아입고 단장하여 문도령을 맞았다. 둘은 만단정화를 나누며 한 이불, 한 요에, 잣베개 같이 베고, 연 삼년 속여 오던 사랑을 풀었다. 아침이 되자 문도령은 박 씨 한 알과 얼레빗 반쪽을 꺾어 자청비에게 주면서, 박 줄이 뻗고 딸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문도령을 찾아 나선 길
그러나 박은 익어 가도 문도령은 돌아올 줄을 몰랐다. 답답한 자청비는 이웃집에 놀러갔다 와서는 공연히 심술을 부렸다.
“어머니, 옆집엔 마른 장작, 젖은 장작 겹겹이 쌓여 가는데, 우리 집 종 정수남이는 밥이나 처먹고 반찬이나 축내고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문도령한테서 소식 한 자 없으니 자기에게 심술을 내는 것이라 생각한 눈치 빠른 종, 정수남이가 능글거리며 말했다.
“아가씨, 쇠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 준비해 주시면 산에 가서 십년 쓸 나무와 아가씨 시름 달랠 진달래꽃도 한 아름 해오겠습니다.”
정수남이는 산에 올라 잠만 자면서, 소 아홉, 말 아홉을 다 잡아먹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삼천궁녀들과 놀고 있는 문도령을 구경하다 보니 쇠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 다 도망가 버렸다고 문도령 핑계를 대었다.
문도령이 절세미인들과 놀고 있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청비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문도령을 본 거기가 어디냐? 내가 가면 볼 수 있을 거냐?”
“아가씬 걸어 못 갑니다. 말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 말 준비하마.”
“점심도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제가, 가는 길, 올 때를 잘 알아 두었습니다. 모레 사‧오시에 또 오겠다고 합디다.”
자청비를 겁탈하려는 정수남과 그녀의 지혜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따라 점심을 차리고 굴미굴산에 올라갔다. 정수남이는 말이 날뛸지도 모르니 우선은 자기가 타야 한다고 하면서 자청비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고는, 가시덤불만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온 산을 두루 헤매게 했다.
험한 숲 속을 한나절동안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헤맨 자청비는 목이 빠짝 말랐다.
“어디 물 있는데 좀 가르쳐다오.”
정수남이는 물이 먹고 싶다는 자청비에게, 이 물은 개구리 오줌 갈긴 물이라 먹지 못하고, 저 물은 지렁이 기어간 물이라 먹지 못한다 막으면서 점점 깊은 숲 속으로 데려갔다.
이윽고 어느 개울에 다다르자 정수남이는 옷을 활활 벗어던지고는 물가에 엎디어 물을 벌컥벌컥 마셔대면서 자청비에게 말했다.
“아가씨, 이 물은 예사 물이 아닙니다. 총각 죽은 물이니, 귀신 들지 않으려면 나처럼 깨끗한 몸으로, 옷도 다 벗고, 손발은 적시지 말고 거꾸로 엎디어 먹어야합니다.”
목이 탈대로 탄 자청비는 할 수 없이 옷을 홀딱 벗고 엎디어 물을 먹었다.
정수남은 자청비의 옷을 높은 가지 위에, 여기 저기 휙휙 던져버렸다.
물을 다 먹은 자청비가 옷을 입으려 하니 옷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오곡의 신 자청비. 홍진숙 그림
문도령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층 야위어진 자청비의 벗은 몸을 보자 정수남이는 더 노골적으로 능글거렸다.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속았음을 알고, 꾀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정수남아 어서 내 옷을 가져다 다오.”
“아가씨, 옷 가져다주면 나한테 뭘 주겠소? 이리 옵서, 그 야들야들한 손이나 한번 잡아보게.”
“내 손목을 잡느니 내 방에 가면 금봉채가 있단다. 그게 훨씬 야들야들 하단다.”
“아가씨, 이리 옵서, 그 뽀얀 젖가슴이나 쪼금만 만져 보게.”
“내 젖을 만지느니 방에 은당병이 있단다. 그게 더 뽀얗고 곱단다.”
“아가씨, 이리 옵서, 달코롬한 입이나 한번 맞춰보게.”
“내 방에 가면 꿀단지가 있단다. 그게 훨씬 달단다.”
“아가씨, 이리 옵서, 나랑 한 번 같이 누워보게.”
다섯 구멍을 막으면 두 구멍을 빼고 - 그녀의 성의식
밤은 깊어가고, 더 이상은 몸은 몸대로 욕을 보고, 목숨도 죽게 생겼다 싶은 자청비가 말했다.
“그래, 오늘 밤 꽉 껴안고, 긴긴 밤 짧디 짧게 보내보자. 움막이나 짓고 자자.”
정수남은 야수처럼 할딱거리면서 움막을 지어갔다.
“정수남아, 움막에 구멍이 너무 뻥뻥 뚫여 있구나. 하늘이 보는데 어찌 벌거벗고 정을 통하겠느냐. 바깥에 나가서 숭숭 뚫린 구멍을 잘 막아라.”
정수남이는 바깥에서 열심히 구멍을 막기 시작했다.
정수남이가 밖에서 다섯 구멍을 막으면 자청비는 안에서 두 개를 빼고, 세 개를 막으면 두 개를 빼며 시간을 벌었다.
이것도 막아라, 저것도 막아라 하다 보니 먼동이 트고 날이 밝았다. 자청비는 지치고 악에 뻗쳐 살기등등한 정수남이를 달랬다.
“정수남아 너무 고생했다. 화만 내지 말고 이리 와서 은결 같은 내 허벅지에 누워라. 머리에 이나 잡아주마.”
정수남은 자청비의 옥같이 하얀 허벅지에 누웠다. 자청비가, 가늘고 흰 손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헤집으며 이를 잡으니, 밤새도록 뛰어다닌 정수남이는 소르르 눈을 감고 드르렁 코를 골았다. 자청비는 이때다 하고, 청미래덩굴을 꺾어 왼쪽 귀에서 찌르고 오른쪽 귀로 빼내고, 오른쪽 귀로 찔러 왼쪽 귀로 빼내니 정수남이는 바들랑바들랑 거리다가 구름산에 얼음 녹듯 죽어버렸다. <계속>
* 신화의 내용은 현용준과 문무병 선생님의 채록본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신화 속 이름들, 신들의 이름, 새나 꽃의 이름들은 ‘속성’으로 생각하여, 맞춤법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2/03/120305_4f54b9941b64d.jpg|4489622|jpg|제주2.jpg|#2012/03/120305_4f54b997abe7d.jpg|372927|jpg|제주1.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덧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