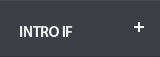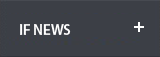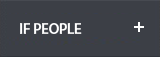- 이프북스
- 대표 유숙열
- 사업자번호 782-63-00276
- 서울 은평구 연서로71
- 살림이5층
- 팩스fax : 02-3157-1508
- E-mail :
- ifbooks@naver.com
- Copy Right ifbooks
- All Right Reserved
 HOME > IF NEWS > 여성신화
HOME > IF NEWS > 여성신화

-
[39회] ‘죽은 이들의 협곡’을 걷다
김신명숙 / 2011-12-12 06:05:08 -
10월 13일.
이 날은 흔히 ‘궁’이라고 하는 미노아 시대 주요 성소(sacred center)들 중 하나인 카토 자크로스 (Kato Zakros) 성소를 순례하는 날이었다.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에 이어 네 번째 규모를 갖춘 성소이자 우리가 방문한 마지막 성소였다.
버스로 직접 입구 근처까지 갔던 다른 곳들과 달리 카토 자크로스를 향해 가는 길은 험했다. 1시간 반 정도 야생의 기운이 넘치는 협곡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9시에 호텔을 떠난 우리는 동쪽을 향해 달려 시테이아(Siteia)란 도시에 멈췄다. 그곳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을 잠시 들르기 위해서였다. 크레타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그 작은 박물관에는 모클로스와 카토 자크로스 등 동부 크레타에서 발굴된 미노아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형A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카토 자크로스에서 발굴)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박물관을 나온 우리는 버스에 올라 협곡 걷기를 시작할 아노 자크로스(Ano Zakros)를 향해 동남쪽으로 달렸다. 크레타의 동쪽 끝으로 가는 것이었다.
▲시테이아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선형A문자(미노아인들의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해골의 눈구멍같은 동굴들
크레타 동쪽 끝 지역의 풍광은 중부 지역과 좀 달랐다. 더 거칠고 열대의 기분이 느껴졌다.
협곡을 걷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때까지 익숙했던 ‘둥글고 작고 평화로운’ 인상과는 매우 다른 크레타의 새로운 면모와 만났다. 오랜 세월 강물의 침식에 의해 깎여져 형성된 골짜기는 바위산을 가르며 거칠고 거대했다.
협곡의 이름도 ‘죽은 이들의 협곡’.
바위 골짜기 양쪽 급경사를 이룬 벽면에는 해골의 눈구멍같은 동굴들이 이곳저곳에 움푹움푹 파여 있었는데 그곳들이 초기와 중기 미노아 시대(약 3000-1700 BC)에 무덤으로 쓰였다고 했다. 사람들의 시신을 그곳에 두었다는 것이다.
 ▲죽은 이들의 협곡(상)과 해골 눈구멍같이 파인 동굴들(하).
▲죽은 이들의 협곡(상)과 해골 눈구멍같이 파인 동굴들(하).
커다란 바위들이 뼈대를 드러낸 거칠고 황량한 협곡 사이로 나 있는 길도 역시 험한 편이었다. 돌들이 박혀 있고 경사가 있는데다 잡목이나 잡풀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다. 크리스트를 비롯해 나이 많은 일행들의 걸음걸이가 좀 염려되는 순간도 있었으나 도움받기를 극히 꺼려하는 그네들의 문화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할 수 밖에 없었다.
정오를 향해 가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협곡 사이의 거친 길을 터벅터벅 걷는 일은 묘하게 자극적이었다. 편하지 않은 길, 거칠고 황량한 풍경이 주는 도전적 느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골짜기가 뿜어내는 야성적 에너지 때문이었을까, 어느새 나는 걷기를 즐기고 있었다.
가끔은 아름다운 야생화들도 모습을 드러냈고 앞서 간 사람들이 쌓아놓은 작은 돌탑들도 눈에 띄었다.

 ▲(시계방향으로)황량하기 그지없는 바위벽, 경험 있는 트레커들만
▲(시계방향으로)황량하기 그지없는 바위벽, 경험 있는 트레커들만
 조심해서 걸어가라는 안내판, 걷다가 본 야생화, 작은 돌탑.
조심해서 걸어가라는 안내판, 걷다가 본 야생화, 작은 돌탑.굽이굽이마다 새로이 펼쳐지는 이국의 풍광에 감탄을 이어가며 계속 걷던 어느 순간, 크리스트가 한 곳에서 일행을 모았다. 그리고 한쪽에 치솟은 벽면 저 위쪽에 나 있는 4개의 동굴 구멍을 가리켰다.
“누구 저 위 구멍까지 올라가 볼 사람 없어요? 그리 어렵지는 않을텐데?”
이미 많이들 지쳐서인지 선뜻 나서는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나선 사람은 세 명. 가장 젊은 20대 캐시와 강건한 신체를 지닌 소방공무원 캐리, 그리고 나였다.
크리스트 말대로 올라가는 길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올라가 보니 구멍은 생각보다 컸고 시원하면서 아늑했다. 밑에서 기다리는 일행만 아니라면 한동안 앉아 쉬고 싶었다. 불교국가라면 불상을 깎아놓고 수도승들이 들어앉아 있을 법한 곳이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밑에서 올려다 보고 있는 일행을 내려다 보는데 크리스트가 소리쳤다.
“자, 거기서 양 팔을 들고 여신 포즈를 취해 보세요”
우리 셋은 그녀의 말을 따라 양 팔을 들었다. 팔굽은 굽히고 양 손바닥은 앞으로 하고.
저절로 미소가 나왔다. 협곡에 감도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면, 역시 착각이었을까?
 ▲동굴속에서 여신 포즈를...(상) 동굴에서 내려다 본 일행들(하).
▲동굴속에서 여신 포즈를...(상) 동굴에서 내려다 본 일행들(하).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의 순례는 각성을 위한 더 큰 여정 속의 많은 작은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례는 인생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성소들에서 조상들과 연결되는 여정을 경험했고, 톨로스 무덤에서 죽음과 재생의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육타스 산에선 세상의 꼭대기를 향한 여정을, 스코테이노 에일리테이아 딕티 그리고 트라페짜의 신성한 동굴들에서는 탄생과 재탄생의 자궁을 향한 여정을, 모클로스 바닷가에서는 영혼과 몸의 중심에 이르는 여정을 경험했지요.
여기 자크로스의 죽은 이들의 협곡에서는 풍경 자체가 여정입니다
......
순례길에서 우리는 영혼에 씨앗을 뿌립니다. 협곡을 걸을 때 우리의 발자국에 유념합시다. 우리는 앞선 사람들이 그랬듯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남깁니다. 또 앞선 사람들이 그랬듯 여기서 에너지를 받습니다....도교에서는 우리의 발바닥이 ‘솟아오르는 샘’이라 불리는 음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땅의 에너지가 단전까지 올라온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이들의 협곡을 딛는 매 걸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구 어머니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곡과 당신의 가슴을 우리 자신의 치유, 지구 어머니의 치유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우며 걸어가세요“
협곡을 걷기 전 그때까지의 순례여정을 정리하며 읽었던 내용이었다. 동굴에서 내려와 강물의 여정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계속 걸으며 나는 어쩌다 중년의 나이에, 몇 년전만 해도 있는지조차 몰랐던 여신순례 길을 걷고 있는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명암이 엇갈리며 더 장엄해진 협곡(상)과 앞서 걷고 있는 캐롤 크리스트.
▲명암이 엇갈리며 더 장엄해진 협곡(상)과 앞서 걷고 있는 캐롤 크리스트.
스무살 무렵 나는 기자나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기자가 됐다. 하지만 서른 살 무렵 아이 하나를 둔 엄마 기자로서 나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렸다. 숨이 막혔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 채 일단 걷던 길에서 벗어났고, 서른 중반 어쩌다 독일에 가서 운명처럼 페미니즘과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프를 만났고 소설도 썼고 어찌어찌 방송활동도 하게 됐다. 페미니스트가 된 이후 내 삶의 두 주제는 페미니즘과 ‘삶과 죽음의 근본적 문제’였으나 그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길인 것같았다. 그래서 어느 쪽도 온전하지 못한 채 기우뚱거렸다. 그러던 마흔 중반의 어느날, 우연히 여신을 만나 그 둘이 여신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의 환희란!
그렇게 기쁨에 넘쳐 걷기 시작한 여신의 길. 그 길은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삶의 신비와 중심을 느끼고 믿으며, 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 걸어갈 뿐.
가능하면 아름답게.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1/12/111212_4ee5c1e5e6dbf.jpg|48870|jpg|1.jpg|#2011/12/111212_4ee5c1ea8456a.jpg|78487|jpg|2.jpg|#2011/12/111212_4ee5c1eeca81c.jpg|84390|jpg|3.jpg|#2011/12/111212_4ee5c1f405909.jpg|65693|jpg|4.jpg|#2011/12/111212_4ee5c1f8cab06.jpg|92747|jpg|5.jpg|#2011/12/111212_4ee5c1fd01dd0.jpg|80599|jpg|6.jpg|#2011/12/111212_4ee5c200f3318.jpg|91997|jpg|7.jpg|#2011/12/111212_4ee5c2043eaac.jpg|70826|jpg|8.jpg|#2011/12/111212_4ee5c382785c0.jpg|77897|jpg|9.jpg|#2011/12/111212_4ee5c4211d6d9.jpg|148492|jpg|10.jpg|#2011/12/111212_4ee5c4270fd22.jpg|49513|jpg|11.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덧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