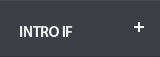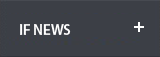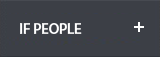- 이프북스
- 대표 유숙열
- 사업자번호 782-63-00276
- 서울 은평구 연서로71
- 살림이5층
- 팩스fax : 02-3157-1508
- E-mail :
- ifbooks@naver.com
- Copy Right ifbooks
- All Right Reserved
 HOME > IF NEWS > 문화/생활
HOME > IF NEWS > 문화/생활

-
[3회]삶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정박미경 / 2014-08-12 01:57:12 -
칠십 평생을 살아온 애접꿍에게 “살면서 만난 이들 가운데 가장 측은한 이가 있다면 누구이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안자언니라는 분을 떠올린다. 안자언니의 인생 스토리는 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삶의 가혹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가슴 아프다.
안자언니는 애접꿍보다 서너살 위인 사촌지간 친척이다. 안자언니를 낳은 어머니는 산후통으로 사흘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안자언니와 그 위 오빠는 그렇게 생모를 잃었다. 안자언니는 ‘에미 잡아먹고 혼자만 살아남은 년’이 되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편안한 잠자리 한번 맛보지 못하고 자랐다. 안자언니의 아버지는 곧 부인을 새로 얻었다. 새엄마는 결혼 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계속 낳아 안자언니는 밑으로 다섯이나 되는 동생들을 두게 되었다. 자식 일곱에 부모까지 아홉식구의 모든 뒤치다꺼리는 안자언니의 몫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길어다 밥을 하고 반찬거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자언니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식구들 밥 먹을 동안 한쪽 구석에서 깐밥이나 찬밥을 먹었고, 식사가 끝나면 그 많은 설거지를 혼자서 해냈다. 성인이 들어가 목욕할 정도로 큰 무쇠솥을 씻어내는 일은 무엇보다 고역이었다. 지금이야 철수세미 같이 그릇을 쉽게 씻어내는 설거지 용품들이 많지만, 그 시절에 설거지는 마른 지푸라기를 엮어 단단하게 만들어 사용했으니, 오롯이 사람 힘으로 누른 밥이나 음식 찌꺼기를 떨어내야 했다. 그렇게 무쇠솥과 한판 씨름을 벌이고 나면 다시 오후에 쓸 물을 길기 위해 항아리를 이고 두어 번을 동네 공동우물에 다녀왔다.
에미 잡아먹은 년
물항아리가 넘실넘실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야 새엄마는 안자언니를 학교에 보내주었다. 안자언니의 부모는 딸을 애초에 학교 보낼 생각은 없었다. 애접꿍의 아버지가 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안자언니가 부엌데기만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애접꿍과 함께 학교에 입학시킨 터였다. 애접꿍은 학교 가는 길에 꼭 안자언니 집에 들러 “안자성, 학교 가요”하고 사리문을 두드려댔다.
그러나 안자언니는 한번도 애접꿍과 함께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애접꿍이 그 집에 당도할 때면 안자언니는 늘 무쇠솥과 씨름하거나, 우물에 물을 길러 가고 없었다. 애접꿍은 그런 안자언니를 기다리다 다른 동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먼저 학교로 출발하곤 했다. 그렇게 동구밖을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보면 저 고개 뒤편에서 “애접꿍아, 같이 가자”며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쫓아오는 안자언니가 보였다.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안자언니는 안그래도 퉁퉁 얼어붙은 몸뚱이를 눈 속에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안자언니는 깁다 깁다 걸레가 되어버린 저고리와 바지인지 치마인지 모를 아랫도리를 입고 달려왔다. 제 몸에 맞는 옷은 언감생심이라, 헐렁한 아랫도리는 눈과 비바람에 제 혼자 신나 펄럭거리며 안자언니의 가날픈 몸체를 드러냈다. 옆구리에 낀 다 떨어진 보자기에는 달력 뒷장을 묶어 만든 공책 비스무리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 보자기를 옆구리에 차고, 안자언니는 연신 부르터진 손을 호호 불어댔다. 겨울로 접어들면서부터 그 손은 늘 얼어있었고 어느 날에는 피도 났다. 겨울 내내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 피떡지가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던 손, 그 손은 안자언니가 앞으로의 삶을 보여준 어떤 징후 같이 느껴졌다.
▲큰 무쇠솥을 씻어내는 일은 안자언니에게는 고역이었으리라
피떡지가 붙은 동상 걸린 손
그래서였을까. 학교가는 길에 안자언니와 동행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애접꿍은 늘 그 집을 먼저 들렀다.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안자언니에게 학교가자며 사립문을 흔들어댔다. “무쉰 연유가 있어서였능가는 모르것는디, 걍 안자성이 학교에 가야할 것 같아서 그리 했제. 그 어린 것이 지보다 더 큰 무쇠솥을 굴림시로 때깔 내는 걸 보믄 내 어린 마음에도 영 시린 머시기가 느껴졌던 것 같어. 학교라도 가야 그 일을 안할테니 말여. 내가 나타나믄 안자성은 어떻게든 설거지를 빨리 끝낼라고 용을 썼던 것 같어. 그라믄 그 새엄마는 옆에서 물 길러와라, 걸레 빨아 와라, 더 악독하게 굴었던 것 같어.”
새엄마여서 더 악독하게 굴었는지에 대해 애접꿍은 단호했다. 지 새끼면 그 추운날 동상 걸릴 정도로 설거지를 시키겠냐는 것이다. 지가 낳은 자식새끼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구워 삶으면서, 지가 낳지 않은 딸내미는 식모처럼 부려먹는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다.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을 제 자식보다 더 귀히 키운 반대의 사례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은 본 바가 없으니, ‘의붓어머니’에 대한 애접꿍 자신의 생각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애접꿍의 기억 속에 안자언니의 새엄마는 그렇게 표독스런 인물로 남아있다.
안자성은 학교를 대충 마치고서는 곧 결혼을 했다. 나이가 여간 차서 초등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애접꿍의 아버지가 중매를 하셨다. 당시는 누구든 나이 먹은 처녀 총각을 맺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 생각했던 시대인지라, 조카를, 그것도 당신 손으로 학교에 넣은 나이 먹은 조카를 중매서는 것은 당연했다. 안자언니가 시집간 곳 또한 무척 가난한 집이었다. 시내라고는 하지만 방한 칸 부엌 한칸의 초라한 살림이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시아제들이 모두 방 한칸에서 생활했다.
무쇠솥과 씨름하는 고단함은 언제까지
안자언니 남편은 성실했지만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까탈스러워서 안자언니에게 불끈불끈 성을 내곤 했다. 남편은 이 지역 경제성장에 한몫을 담당했던 00 방직에 취직을 했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됨됨이를 높이 산 회장님께서 자신이 타는 자동차를 몰게 했다. 말하자면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 끼니 걱정은 덜게 되었지만, 시동생을 모두 시집장가 보내는 것은 모두 안자언니의 몫이었다. 네 명의 시동생과 다섯 자식을 키우고 짝을 맺어주기 까지, 안자언니는 삶이라는 무쇠솥과 씨름하는 고단함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다.
그렇게 고생은 끝났는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남편의 성격을 꼭 닮은 큰아들이 어미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난데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더니, 어미에게 욕하는 행패까지 부린 것이다. 큰아들의 패악질에 안자언니는 쓰러졌다. 그리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일어나 움직이고 먹고 화장실가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언어 구사에 장애가 오고 감정 표현도 쉽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애접꿍은 안자언니의 병문안을 갔다. 이십년 만에 만난 안자언니는 딸의 수발을 받고 있었다. 적은 체구가 더 적어져 마치 늙은 얼굴을 한 어린아이 같았다. 안자언니는 애접꿍을 보자 자지러지도록 웃고 웃고 또 웃었다. 나를 알아보는 것인가, 반갑다는 표시인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듣고 애접꿍은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미친 듯한 웃음소리, 그 수수께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앞으로의 삶은 편안하라고 지어준 이름, 안자, 애접꿍은 안자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이름을 계속 되뇌었다. 안자, 편안하게 살아라. 안자언니의 삶은 누가 보아도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붓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까탈스러움, 자식의 행패까지 겪은 삶이니 말이다.
피떡지가 달라붙은 동상걸린 손등이 생각났다. 무쇠솥을 씻어내느라 몸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온 그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그의 인생은 그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가. 그 무거운 무쇠솥을 놓아버린 후에야 그렇게나 순수한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정신줄을 놓은 이제서야 안자언니는 편안해진 것인가. 온갖 질곡을 겪어온 천진난만한 웃음은, 마치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수수께끼 같았다.
덧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