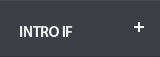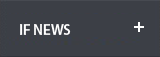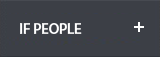- 이프북스
- 대표 유숙열
- 사업자번호 782-63-00276
- 서울 은평구 연서로71
- 살림이5층
- 팩스fax : 02-3157-1508
- E-mail :
- ifbooks@naver.com
- Copy Right ifbooks
- All Right Reserved
 HOME > IF NEWS > 문화/생활
HOME > IF NEWS > 문화/생활

-
[13회]더운 날 바람 여행
조윤주, 김우 / 2013-09-23 11:33:50 -
일단 결정부터 하고
“난 가요!”
윗집 사는 박짱이 대륙 횡단 철도 여행이 있다기에 두말 않고 외쳤다. 기차를 타고 가도 가도 펼쳐지는 평원을 보고 싶었다. 거칠 것 없는 평원에서 뜨고 지는 해를 보고 싶었다. 평원에 누워 주먹만 한 별이 쏟아지는 걸 보고 싶었다. 별똥별에 소원도 빌어 보고 싶었다. 난 느리지만 별똥별은 수시로 떨어져줄 테니까.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마침 전에 조합원이었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출자금을 돌려줄 시기가 됐다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영구터전을 마련한 어린이집에 약정한 기부금을 제하고도 여행 경비가 마련됐다. 멋진 타이밍.
‘7박 9일의 여정동안 아이들은 어쩐다?’ 남편이 여름휴가를 받아 양쪽 집에도 가고 아이들과 물놀이도 다니는 것으로 했다. 아이들은 방학, 남편은 휴가. 딱 좋다~
여행 안내 메일을 받았다. ‘희망내일’로 들었는데 (사)희망래일이란 곳에서 추진하는 여행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광활한 대륙으로 길을 여는 것을 꿈꾸는 곳이라 했다. 난 검색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보다 믿는 사람에게 들으면 그냥 믿고 선택하는 유형, 에니어그램 가슴형이다. 일단 결정부터 하고 알아가는 건 과정 속에서 겪으며 천천히.
헌데 메일을 대충 훑어보다 참가자를 보고 허걱했다. 이사, 국회의원, 사무총장, 교수, 가수, 변호사, 기자, 대표, …. 흠. 지위도 있으시고, 당연 연세도 있으시겠고, 같이 놀긴 어렵겠단 생각이 들었다. 뭐 어떠냐. 난 대자연을 보러 가는 건데.
별은 내 가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천진으로, 천진에서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열차를 탔다. 마을에서 같이 간 봄봄, 박짱, 에이미와 4인용 객실을 썼다. 박짱과 에이미가 한 상자 분량의 부식을 싸가지고 왔기에 손만 내밀면 먹을 게 쥐어졌다. 2층 침대를 쓰니 오르고 내리기가 불편한데 그 불편함으로 ‘공주’의 삶을 살았다.
“창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 아래층의 ‘시종’이 창문을 열어 주는 식이었다. 창밖 바람이 얼음 바람이었다. 8월 중순의 진정한 피서.
새벽에 박짱이 별을 보라고 깨워 주었다. 2층에 누운 채 고개가 부러져라 하늘의 별을 보았다. 이 정도는 약과. 몽골의 초원에서 별의 진수를 봐야지 다짐했다.
아침엔 열차 화장실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았다. 봄봄이 따라 주는 커피포트의 물로 세수했다. 예전 귀족들의 호사스런 세수법.
몽골에선 테를지 국립공원 게르가 숙소였다. ‘청정지역인 대초원 밤하늘에서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별무리와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별 관측지’라는 여행안내 책자 문구. 가슴 두근거리며 새벽을 기다렸다. 하지만 새벽 내 보슬보슬 비가 왔다. 뭐 그래도 좋았다. 징기스칸 보드카와 긴긴 밤 함께 했으니. 또 내겐 ‘특별히 사계절의 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관측의 명소’ 알혼섬이 남아 있으니.
알혼섬에선 후지르마을에서 캠프파이어하는 내내 고개 들어 하늘을 봤지만 이 날은 또 달이 너무 밝았다. 바이칼 보드카로 속을 달랬다. 정말 ‘주먹만 한 별’이란 게 과장 없는 진실일까. 아무튼 별은, 다음을 기약하는 내 가슴에.
▲몽골. 실비를 맞으며 말을 탔다.
▲러시아. 호텔에서 바라본, 지는 해. (아프리카 다큐를 보면 화면을 꽉 채우는,
지는 해가 나온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렇게 크고 붉은 해를 볼 수 있는 걸까.)내가 좋아하는 여행은
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무슨 문, 무슨 성, 무슨 거리, 무슨 전망대, 무슨 궁정, 무슨 광장, 무슨 박물관, 무슨 동상, …. 우르르 버스에서 내려 가이드 설명 듣고 단체 사진 찍는 시내 관광은 역시나 매력이 없었다.
그보다는 가도 가도 끝없는 들판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았다. 들판이 사랑이라면 앤드리스 러브. 가도 가도 사랑. 지나도 지나도 사랑. 들판이 그리움이라면 뜯어도 뜯어도 새록 돋는 그리움. 물주지 않아도 절로 자라는 그리움.
서커스나 전통공연 관람도 별로였다. 게르에서 짐을 날라주고 난로도 피워주며 아르바이트하는 예술학교 친구들의 소박한 공연이 더 좋았다. 호텔보다 게르에서 자는 게 더 좋았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여행은 자연을 만나는 여행이다. 그 안에서 나를 만나는 여행이다.
여정의 마지막. 바이칼이 최고로 멋졌다. 마흔 살 그랜드캐니언, 마흔두 살 이구아수에 이어 마흔네 살에 바이칼의 풍광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 행운이었다.
4륜구동 ‘우아직’에 몸을 맡기고 달리는 건 러시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이었다. 하보이곶에 가니 하늘의 새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물 위에 떠있는 새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게 새삼스레 느껴졌다. 장작불 피우고 검댕 냄비 걸어 요리한 오믈은 개콘의 ‘요물’처럼 나를 들었다 놨다할 정도로 맛있었다.
▲하보이곶에서 바라본, 무한 바다 같은 바이칼
이번 여행은 들어가면 10년은 젊어진다는 바이칼호에 종아리도 담근 회춘의 여행이었다. 중국맥주, 군중미주라는 고량주, 마유주, 보드카를 실컷 마시는데도 맑은 공기 탓인지 다음날이 깨끗했던 술 여행이었다. 길을 잃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전화기를 잃어버리고 신고했다가 반나절은 그 처리에 매달리게 된 누군가를 기차역에서 기다릴 때도 여유 있던 일행들로 편안한 여행이었다. 직위나 직함 때문에 경원시하게 될 줄 알았는데 모두가 소탈함으로 어우러지는 여행이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밤에 페치카에 물을 뿌려 증기 사우나 하고 밖으로 나와 앙가라강에 몸을 담갔다.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 몸을 따로 헹구지 않았다. 강물에 함께 들어갔던 티와 반바지는 물기를 짜지 않고 비닐에 담아 가방에 넣어 왔다. 집에 돌아와 젖은 빨래를 대야에 담그기 전에 반나절 전 추억의 냄새를 맡았다.
내가 다시 바냐를 하는 곳에 간다면 하루 이틀은 묵고 싶다. 흰 자작나무 숲길을 오래도록 걷고 싶다. 지난 번 괜히 민망해하며 입었던 옷을 다음엔 벗고 달빛아래 강물에 몸 담그고 싶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junk/130923_5240506833d27.jpg|44086|jpg|019.JPG|#junk/130923_5240506db5992.jpg|53294|jpg|021.JPG|#junk/130923_52405072a254b.jpg|50656|jpg|몽골.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덧글이 없습니다.